
목표가 리스크라니
모든 프로스포츠 구단의 지상 목표는 우승일 것이다. 지려고 경기를 하는 프로는 없다. 우승이야말로 승리를 추구하는 프로구단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경영진에겐 팀의 우승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승까지는 이를 위해 달려온 선수들과 코치진, 프런트 직원들의 노고가 있고 열렬히 응원해준 팬들도 있다. 우승을 차지한 구단은 이 영예의 대가로 적잖은 ‘우승 턱’을 내야 한다. 논공행상과 감사, 결국 돈 문제다.
국내 프로야구 구단은 KBO리그에서 우승하면 배당금을 받는다. 포스트시즌 관중 입장 수익에서 대회 운영비 약 45%를 제외한 금액의 20%가 정규시즌 1위 팀에, 다시 남은 금액 중 한국시리즈 우승팀에 50%가 주어지는 방식이다. 지난해 통합 우승팀 KT 위즈가 이렇게 22억 원가량을 받았다. 얼핏 크지 않아 보이지만 통상 프로야구 한 구단의 연간 운영비가 400억~500억 원 수준이고, 근 몇 년간 대부분의 구단이 1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을 생각하면 꽤 쏠쏠한 규모다.
그러나 문제는 배당금보다 많은 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구단은 당장 우승에 기여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에게 지급할 보너스, 팬들을 위한 이벤트 등에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뒤따를 연봉협상도 있다. 말 그대로 우승했는데? 적어도 1군 명단에 자주 올랐던 이들에게는 서운하지 않을 정도의 고과를 산정해야 한다. 프로구단으로서 우승을 목표로 달려왔지만 기업적 관점에서는 극적으로 달성한 목표가 재정적 리스크로 전환되는 아이러니다.
우승보험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험이라는 게 있다. 공동의 잠재 위험을 가진 이들이 미리 돈을 모아뒀다가 사고가 발생한 개개인에게 지급해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오랜 위험인 해상, 화재사고에 대비하며 발전했는데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해진 오늘날에는 보험도 여러 형태로 진화했다. 우승보험도 그중 하나다. 이 상품은 우승으로 인해 발생할 프로구단의 금전적 위험을 보장한다.
국내 야구계에서는 지난 1999년 LG 트윈스가 처음으로 우승보험에 가입했다. 직전 해에 준우승을 차지했던 LG는 우승 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며 1억5000만 원의 보험료를 냈다. 단순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해보면 현재 가치로 16억6000만 원짜리 보장을 위해 2억4900만 원을 부담한 셈이다. 비록 안타깝게도 그해 6위를 기록하며 빛이 바랬지만 나름 신바람 LG의 참신한 시도였다고 평가한다.
당시 우승보험의 도입 배경을 두 가지로 생각해본다. 하나는 마케팅 측면이다. 구단은 우승보험에 가입한다는 자체로 대내외에 자신감을 피력할 수 있다. 더구나 국내 최초였으니 선수들의 의욕은 물론 팬들의 기대감도 키웠을 것이다. 이로 인한 팬들의 관심 증대와 응집을 일부분 관중 수입 및 유니폼 판매 증가 같은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가능하다. 또 하나는 보험사가 바로 LG화재(현 KB손해보험)였다는 점이다. 이후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 등 여러 구단이 우승보험에 가입했는데 대부분은 그룹 계열사에 보험사가 있는 곳들이었다.
그런데 한계도 있네요
요즘에는 우승보험이 외면받고 있다. 이미 많은 구단이 도입했었기에 더는 우승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마케팅 효과를 가져가기 어렵다. 오히려 장기간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이 우승보험에 든다면 팬들의 비난도 피할 수 없을 터다. 언젠가 삼성화재 관계자로부터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우승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금(성적이 좋았던 작년 이전의 일이었다.) 삼성 라이온즈가 삼성화재에 보험을 든다면 부당 내부거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농담과 함께였다.
사실 우승보험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걸 진짜 보험으로 보기는 힘들다. 대수의 법칙 등 가장 기초적인 원리조차 적용되지 않아 금융상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낮다. 보험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기본 모수가 필요하다. 한 구단으로부터 5억 원의 보험료를 받고 우승 때 10억 원을 보장하는 수준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이 정도는 구단이 보험료를 2년만 모아도 될 일이다. 보험사 역시 연 기대 수익은 5억 원인데 보험사고(가입 구단의 우승)가 발생하면 곧바로 5억 원이 마이너스다. 소비자에게도, 공급자에게도 크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형태다.
만약 10개 구단이 한 보험사에 가입한다면 어떨까? 각 구단이 내는 보험료는 크게 낮아지면서 우승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늘어날 것이다. 상품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삼성 라이온즈가 삼성화재를 제쳐두고 한화손해보험이나 롯데손해보험에 우승보험을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종합적인 리스크 보장으로 간다면
규모가 큰 북미 스포츠 시장은 선수의 부상 리스크에 관한 보험이 활성화돼 있다. 특히 모든 계약이 보장 형태로 이뤄지는 MLB에서는 고액 연봉자의 부상이 치명적인 악재일 수밖에 없기에 상대적으로 보험의 침투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계약액의 5~10% 선에서 형성되며 시즌 연봉의 75%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우승뿐만 아니라 프로야구단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들로 함께 구성해보면 어떨까? 주축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시즌 아웃이나 구단의 법적 분쟁 같은 위험들까지 말이다. 솔직히 우승? 그거 걱정할 팀이 얼마나 된다고… 정말 프로야구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 소비자의 니즈를 공략하라는 얘기다.
일례로 골프에는 홀인원보험이라는 게 있다. 홀인원을 기록하면 크게 ‘한턱’을 내야 하는 특유의 문화에 기인한 상품이다. 최근 골프 대중화에 힘입어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건 홀인원만을 보장하지 않는다. 훨씬 빈번한 골프용품 파손, 대부분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 골프장 위치를 고려한 운전 중 상해, 이따금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까지 아우른다. 그래서 누구도 초보자의 홀인원보험 가입을 비웃지 않는다. 우승보험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고 어엿한 보험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다.
프로야구단도 분명 분산하고 싶은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전례 없던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일 수 있다. 지금은 구단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관중 수입에 타격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해외 보험사들은 코로나로 가동이 정지된 공장의 휴업 손해를 보장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실외스포츠라는 점을 고려해 선수들의 부상 가능성을 키우거나 관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날씨 관련 위험 보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승보험이 지금의 한계를 넘어 괜찮은 보험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야구팬으로서는 프로야구단이 보험을 통해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헷지한다면 다른 방면으로 투자를 늘릴 여력이 생길 것이고, 이는 팬 서비스 확대나 전력 강화 등 어떤 식으로든 환원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더불어 보험업계에도 이게 그렇게 강조하는 또 다른 먹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언을 해본다.
야구공작소 이재홍 칼럼니스트
에디터 = 야구공작소 김준업, 홍기훈
ⓒ야구공작소. 출처 표기 없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상업적 사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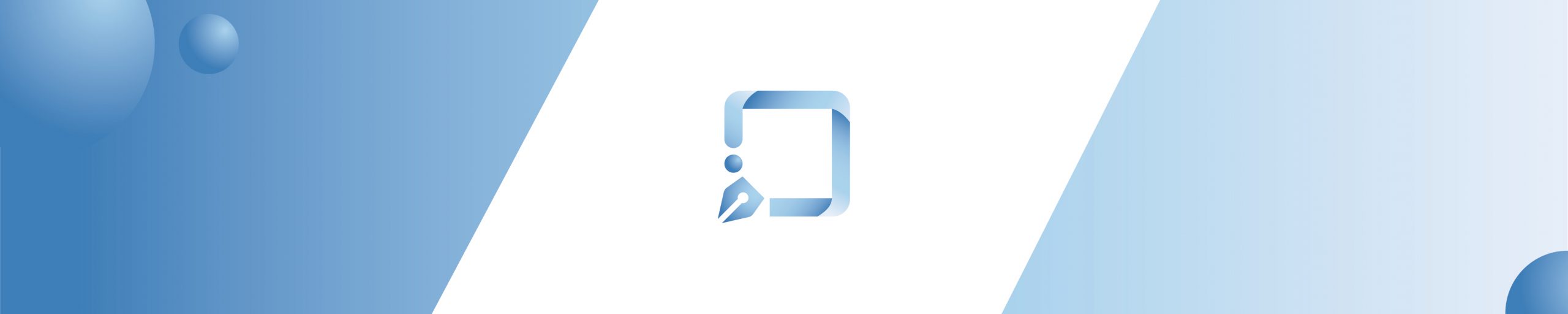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