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공작소 김우빈]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작업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학창시절에도 하교 직전의 수업은 유난히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일과 시간 종료가 임박할 때마다 적당히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려는 충동에 휩싸이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퇴근 본능’이라 부른다. 1년에 144경기를 치르고, 밤이 깊어서야 경기가 끝나는 프로야구 역시 당사자에게는 퇴근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고된 일과일 것이다.
‘퇴근 존’은 이 퇴근 본능이 심판들의 볼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심에서 유래한 신조어이다. 경기 종료가 임박했거나 경기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에서 심판의 후한 스트라이크 콜이 관찰될 때면 팬들은 한 목소리로 ‘퇴근 존’을 외친다. 경기의 진행 속도를 높여 더 빠른 퇴근을 달성하고자 심판이 퇴근 본능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팬들은 승부가 기운 경기 막바지에는 스트라이크 존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2018 공식 야구규칙 2.73에 따르면 KBO 리그의 현행 스트라이크 존은 “어깨 윗부분과 바지 윗부분의 중간 점을 상한선으로 하고, 무릎 아랫부분을 하한선으로 하는 홈베이스 상공”이다. 이영재 심판은 한 인터뷰에서 “1회에 낮은 공을 스트라이크로 봤다면 9회까지 양 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이닝에 따른 스트라이크 존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현 심판위원장인 김풍기 심판 또한 “같은 경기에서는 양 팀 모두에게 똑같은 스트라이크 존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터뷰했다. 이처럼 이닝이나 점수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을 다르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심판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팬들이 느끼는 ‘퇴근 존’은 실재하지 않는 현상인 걸까?

2017시즌 전체 스트라이크 존 (좌) vs 7회 이후 5점 차 이상 한정 스트라이크 존 (우)
위는 2017시즌 KBO 리그에서 실제로 적용된 스트라이크 존이다(포수 시점).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역이 해당 영역 투구 가운데 50% 이상이 스트라이크로 선언된 ‘실제 스트라이크 존’을 뜻한다. 이렇게 계산한 2017시즌 전체의 스트라이크 존 면적은 572제곱인치였다. 그리고 7회 이후 5점 차 이상 상황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570제곱인치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이는 그리 대단한 차이가 아니다. 2017시즌 전후반기의 스트라이크 존 면적만 놓고 비교해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차이가 관찰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오히려 면적이 줄어들었으니 ‘퇴근 존’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퇴근 존’의 유무는 면적 차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스트라이크 존의 분포 양상에서는 보다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위 그림은 스트라이크 ‘판정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깨끗한 형태를 띄는 시즌 전체의 스트라이크 존과는 달리, 7회 이후 5점 차 이상 상황에서의 스트라이크 존에서는 존 안쪽에서 100% 스트라이크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지점이 관찰된다. 존 외곽에서도 깨끗하지 않은 패턴을 띄는 곳이 보인다. 팬들이 지적하는 일관성 없는 판정이 이뤄졌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이러한 ‘퇴근 존’을 만들어내는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 늦은 시간일까,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기 양상일까?
퇴근 본능을 자극하는 요소, 시간 vs 점수

경기 진행에 따른 스트라이크 존 변화
경기 초반인 1~3회의 스트라이크 존은 비교적 우리가 아는 스트라이크 존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 하지만 4~6회로 접어들면서 심판들은 높은 공을 매우 후하게 잡아주는 경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오히려 스트라이크 존은 7~9회로 접어들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형태를 되찾는다. 경기가 끝을 향해 갈수록 분포가 정상화된다는 점에서, 시간의 경과는 퇴근 존을 초래하는 최대 요인이라 보기 어렵다.

이닝별 스트라이크 존 크기 변화 – 50% 이상 기준 (좌), 75% 이상 기준 (우)
그래도 면적만 놓고 보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심판의 존이 넓어진다는 의심은 상당히 사실과 부합한다. 다만 스트라이크 존의 크기를 조금 더 엄격하게 설정해 보면 어떨까? 75% 이상이 스트라이크로 선언된 영역만을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규정할 경우, 이닝이 지날수록 스트라이크 존이 거꾸로 작아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경기 후반이라 퇴근 본능이 발동해서 퇴근 존이 등장했다’는 그동안의 해석은 오락가락하는 판정에 지나치게 맥락을 부여하려 한 실책이었는지도 모른다.

점수 차에 따른 스트라이크 존
반면 점수 차에 따른 존의 변화는 명확했다. 접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 3점 차 이내의 경기에서는 스트라이크 존 크기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5점 차 이상으로 벌어졌을 때부터는 더 커진 것이 보였다. 기준을 75%로 좁힐 경우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이는 거꾸로 드문드문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는 존이 5점 차 이상일 때 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관성의 부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점수 차이별 스트라이크 존 변화 – 50% 이상 기준 (좌), 75% 이상 기준 (우)

점수 차에 따른 스트라이크 판정 비율 – 좌측부터 전체, 3점차 이하, 5점차 이상 순
점수 차가 클수록 심판들은 넓은 스트라이크 존을 적용했다. 면적은 이상해지지 않았지만, 스트라이크 존의 분포가 비정상이었다. 안정적으로 100% 스트라이크 콜을 받던 지점에서 볼을, 볼을 받던 지점에서 스트라이크를 받는 비율이 높아졌다. 흔히 말하는 일관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처럼 승부가 한 쪽으로 기울 때마다 넓게 흩어져버린 스트라이크 존이야말로 ‘심판의 콜에 일관성이 없다’는 인식을 팬들에게 심어준 주범이었다.
권위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KBO는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프로야구선수협회와 감독자 간담회를 열어 ‘선수는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 불필요한 질문을 건넬 수 없다’는 공지사항을 공유했다. 스트라이크 판정을 의문을 표할 수 없는 ‘불가침 영역’으로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근래 선수들과 감독들의 스트라이크 콜에 대한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채태인을 필두로 오재원, 이원석, 이용규 모두가 최근 심판의 스트라이크 콜에 불만을 제기해 이슈가 됐던 선수들이다.
심판도 사람이고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킬 수 있을 때조차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권위를 주장해도 그저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말 것이다.
기록 출처: STATIZ
에디터=야구공작소 이의재
ⓒ야구공작소. 출처 표기 없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상업적 사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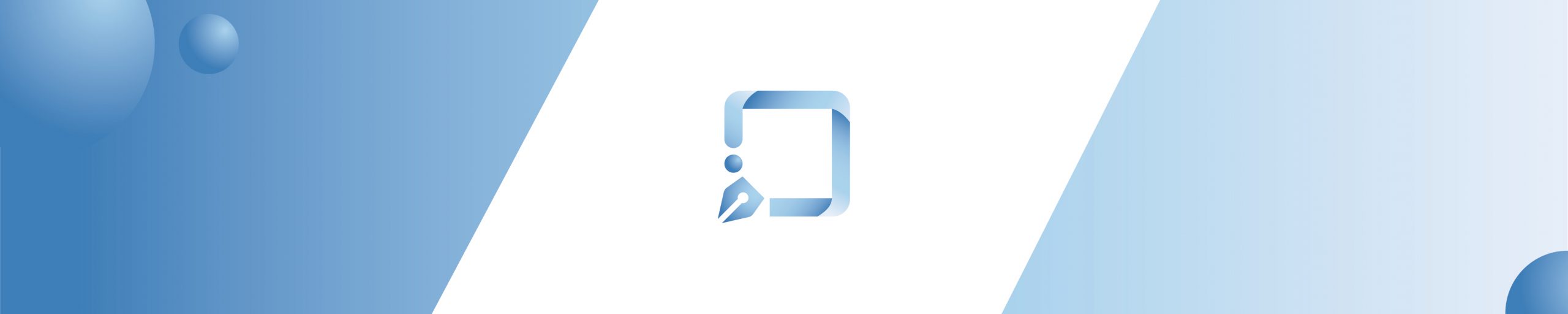
댓글 남기기